오늘은 선형대수와 통계학으로 점철된 나의 뇌를.. 인문학으로 조금 말랑하게 해본 날이다.
대학원 일기는 아니고 회사 일기지만,, 대학원에서 쓰고 있으므로 대학원 일기(?)
회사에서 초청한 고명환작가님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큰 기대를 안하고 들었는데,, 쿠키가 맛있다고 해서 신나게 갔는데;; 두시간이 어떻게 갔는 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들었다. 개그맨 분들이 똑똑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오늘도 또 느꼈다.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서 강의 자체의 요약이라기 보다는 강의에서 뻗어나온 것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생각나면 조금씩 추가해야지.
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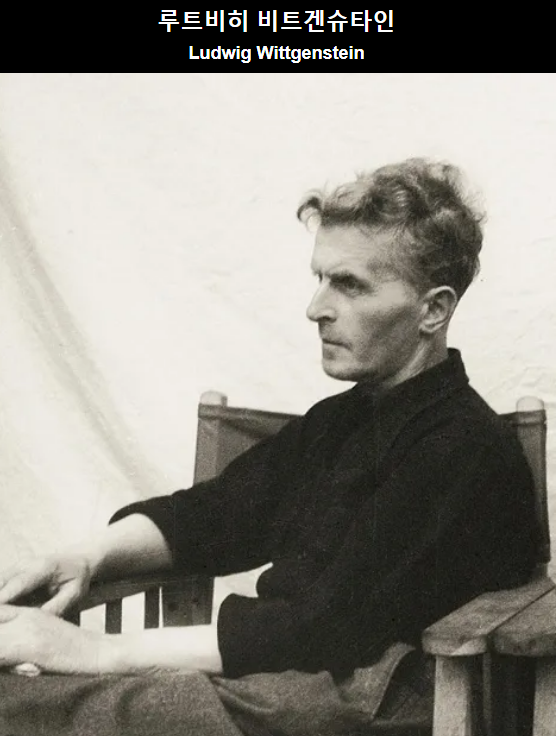
- 1889. 4. 26~ 1951. 4. 29 오스트리아 태생 영국의 철학자.
- 1925~50년 영국 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
- 논리학 이론과 언어철학에 관한 독창적이며 중요한 철학적 사유체계를 제시했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이다"
이 말은 항상 느껴왔던 것. 외국계와 국내사에서 일 할 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때와 한국 친구들을 만날 때, 쓰는 언어에 따라 내 업무 스타일도, 마음가짐도, 성격도 조금씩 달라졌었다. 이 말은 그 언어를 꼭 원어민처럼 잘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소통이 되어서 그 언어의 뉘앙스나 문화적 context를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어떤 경우에나 통용되는 것 같다. (cf. 언어학자 촘스키도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고 말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bilingual정도가 되면 이제 마음가짐이나 성격을 넘어서 뇌과학까지 연결될 수 있겠다. 언어는 뇌과학 뿐 아니라 (조직)심리학, 사회/문화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학부 때 배웠던 이중언어 발달 과정,, '님' 호칭에서 시작하는 조직 문화 변경, 요즘 유행하는 긍정 확언, 언어가 반영하는 문화권의 특성 등등..
호기심이 생기지만 우선 비트겐슈타인의 말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보겠다. (명언이 정말 많았는데 적어놓고 싶은 말만 조금 추려본다.)
-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 생각도 일종의 언어이다.
- 말에는 음악이 깃들어 있다.
-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 마음속 용기야말로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아도 점점 성장해서 거목이 되는 것이다.
-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서 온다.
- 철학자란 건강한 인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안에 박혀있는 다양한 사고의 오류를 고쳐야 하는 사람이다.
- 반대되는 결론도 항상 함께 생각하라.
- 나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단지 즐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만큼은 확신한다.
- 확실하다는 말로써 우리는 완전한 확신, 의심의 부재를 나타내며,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주관적 확실성임을 알아야한다.
-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란 어렵다.
- 인생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때, 우리는 상황이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변화, 즉 자기자신의 태도를 바꿔야한다는 인식에는 거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 사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의외로) 너무나도 단순하고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은 그냥 스쳐가는 것 중에 있다.
- 철학적 탐구는 인간생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2. 답은 책속에 있다.
(강의 내용) 시대를 막론하고 질병과 전쟁은 인류의 숙제였다.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베르 까뮈의 『The Pest』 를 읽어보라, 전쟁이 일어난다면/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키뒤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를 읽어보라.

옛날부터 어른들이 삼국지 읽어라,, 사마천 사기 읽어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다.
아직 나는 뭔가 동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섭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더 깊어져야 할 때가 오면 읽게 되겠지.. 일단 메모부터 해놓고 ㅎㅎㅎ
아무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인간 역사는 반복되니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고전을 찾는 법만 알아 두면 반은 해결된 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펠로폰네소스전쟁사중 일부는 극히 세밀하게-이렇게까지 다 써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서술 되었는데, 투키뒤데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후손들이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참고하라는 생각때문이었다고 한다.)
ChatGPT가 추천하는 고전 목록도 조금 첨부.


3.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강의 내용)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잠재력/창의력이 나온다.
R&D영역에서 창의력 발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맥락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세가지 꼭지가 결합 되었던 것 같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1. 나의 행복과 다른 이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
*채근담 17-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2. 인간은 원래 남을 도우려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갑자기 어린애가 우물에 빠질 것을 본다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놀라고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를 친하게 여겨서가 아니며,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자 함도 아니며, 또한 우물 주인의 원망을 피하려 함도 아니다." - 맹자
(맹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러한 공감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순수한 도덕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3.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천하를 얻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사람은 일을 이루면 이루어질수록 그것을 더욱 애지중지하지만, 일이 이루어지면 멀리해야 한다. 이것이 천도의 도리이다." - 노자, 『도덕경』
+ 무위이화(無爲而化): 도가 철학에서는 무위, 즉 억지로 하지 않음을 통해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오랜만에 머리가 말랑해지는 시간이었다.
바쁜 와중 마음의 교통정리를 해 주었던 고마웠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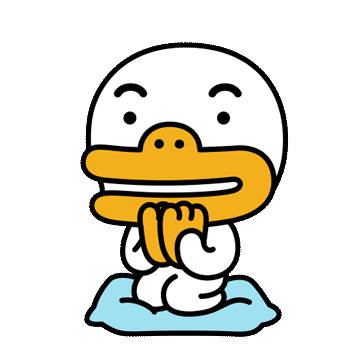
'대학원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GCN] Graph Convolution Network에서 샘플링을 안해볼 순 없을까..? (0) | 2024.10.10 |
|---|---|
| [성균관대 데이터사이언스융합] 기댓값과 분산의 성질을 왜 외워야 하는가.. (0) | 2024.10.08 |
| [성균관대 데이터사이언스융합] 대학원 생활 이모저모 (3) | 2023.10.20 |
| [성균관대 데이터사이언스융합] 논자시(논문제출자격시험).. 후기 (15) | 2023.10.12 |
| [석사학위논문] 논문작성 팁 워크숍 요약 (0) | 2023.02.08 |